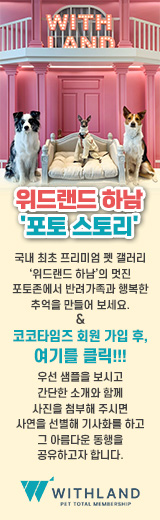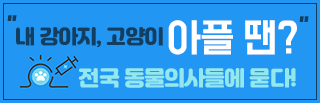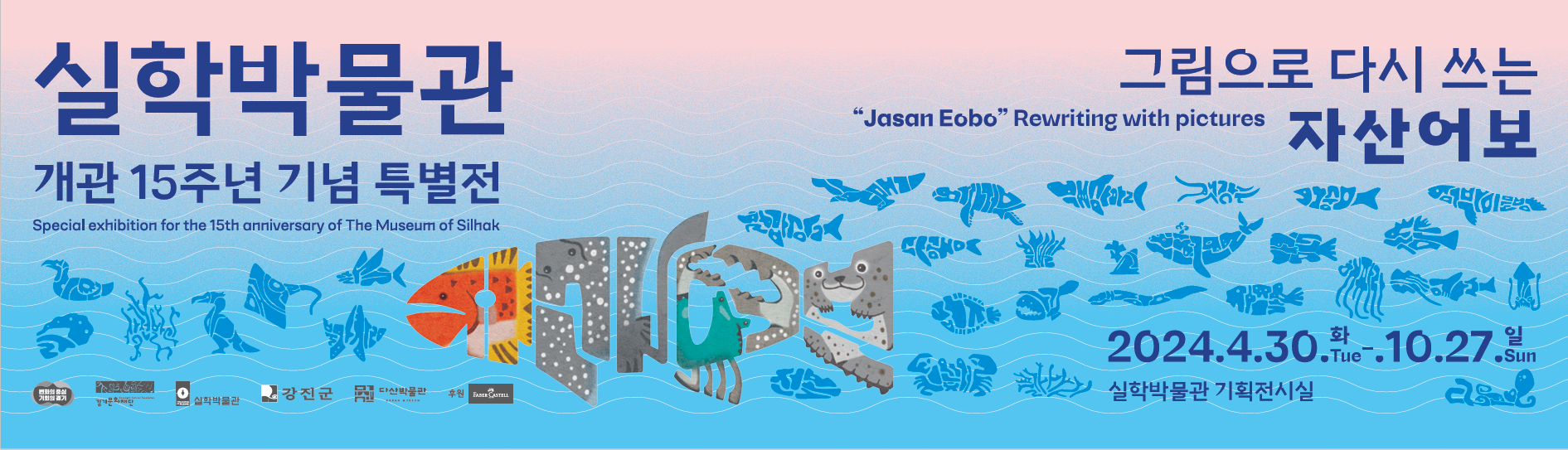반려인 90%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느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 반려인 10명 중 9명, 무려 90%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 정책은 그 20년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에 강석진 의원, 한국소비자연맹,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3일,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여기엔 대한수의사회, 한국소비자연맹, 손해보험협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와 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려인 90%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느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 반려인 10명 중 9명, 무려 90%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 정책은 그 20년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에 강석진 의원, 한국소비자연맹,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3일,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여기엔 대한수의사회, 한국소비자연맹, 손해보험협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와 법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려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 먼저, 소비자단체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 10명중 7명은 진료 후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다. 2017년 기준으로 동물병원들마다 초진비는 최대 6.7배 차이가 났다. 이에 소비자들이 사전에 진료비 정보를 입수하여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려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 먼저, 소비자단체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 10명중 7명은 진료 후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다. 2017년 기준으로 동물병원들마다 초진비는 최대 6.7배 차이가 났다. 이에 소비자들이 사전에 진료비 정보를 입수하여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아래 사진>는 정부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현행법상 동물병원 진료비는 사적 재화에 해당한다. 반려동물 진료서비스가 공공재인지 사적인 재화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공재라면 정부 예산을 적극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적인 재화라면 현재처럼 시장의 자율에 맡기라는 것.
 또 보험업계는 펫보험 보급을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들쭉날쭉해 정확한 손해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동물병원 이익, 치과의 절반도 안 돼" 이에 대해 수의사단체는 표준진료체계를 확립하기도 전에 규제부터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의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동물병원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15.1%였다. 일반의원(33.8%), 치과의원(3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30~40%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충당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소비자들과 수의사업계의 온도차는 이 점에서 비롯된 것.
또 보험업계는 펫보험 보급을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제 및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들쭉날쭉해 정확한 손해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동물병원 이익, 치과의 절반도 안 돼" 이에 대해 수의사단체는 표준진료체계를 확립하기도 전에 규제부터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의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동물병원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15.1%였다. 일반의원(33.8%), 치과의원(3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30~40%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충당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소비자들과 수의사업계의 온도차는 이 점에서 비롯된 것.이에 대해 농수산식품부 신만섭 사무관(구제역 방역과)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공개는 동물진료 표준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동물진료 표준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수의사단체의 의견과 궤를 같이한 것. 표준진료체계 도입돼야 펫보험도 활성화 결국 이날 토론회는 동물병원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두루 제기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뜻 깊은 자리였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겨우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야 할 시기"라는 당연한 방향성에만 겨우 공감했을 뿐. 한편 국내 펫시장은 2017년 2조3천여억에서 2027년 전후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보험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억원 수준으로 국내 펫시장의 0.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표준 진료체계가 도입되면 펫보험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